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마음이 식은 상태'는 너무 막연할뿐더러 별다른 소재가 생각나지 않아, 그 반대인 '마음이 식지 않은 상태'를 생각해보기로 했다. 한번 꽃히면 식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린 나의 사촌동생들이 있다. 이 두 동생들이 각각 꽃힌 대상은 개미와 트럭. 길을 가다 보이는 모든 개미와 트럭에 반응하니 나로서는 황당할 따름이다. 개미를 관찰하는 A군은 가만히 앉아서 지나가는 개미들의 크기, 움직임, 먹잇감 등을 일일이 관찰하고 심지어는 개미를 채집해 집에서 기른다. B군은정차된 트럭, 달리는 트럭, 심지어는 유튜브에서조차 트럭과 관련된 영상만 찾아서 본다. 그저 나에게 개미와 트럭은 수없이 많은 곤충 중 하나일 뿐이고, 수없이 많은 차의 종류 중 하나일 뿐이다. 이 친구들을 보고 있자니, 문득 나도 저만큼 어릴 때, '마음이 식지 않는' 대상이 있었는지 궁금해졌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 보니, 나에게도 '마음이 식지 않는' 대상이 있었다. '눈'이었다. 나는 부산에서 근 10여 년간을 나고 자랐다. 부산은 워낙에 서울보다는 따뜻한 곳이라 겨울에도 눈을 구경하기란 정말 어려웠다. 어린 시절에는 눈이 제법 쌓여 아버지 품에 안겨서 찍은 사진이 있기는 하나, 그 때 나는 '눈'을 '눈'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다 한 9살 쯤 되었나, 한참 추운 겨울에 집을 나오는 길이었는데 정말 쌀알만한 눈이 하늘에서 막 내리던 참이었다. 육교를 지나던 나와 동생은 한참을 내리는 눈에 기뻐했다. 아직도 그 장면만 또렷하게 머리 속에서 재생이 된다. 또 중학생 때는 새벽에 내린 눈을 아무도 밟기 전에 소유하고 싶어서 눈을 뜨자마자 동생들과 나가 눈 밭에 드러눕고는 했다. 추운 줄도 모르고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그 때면, 눈 그 자체로 충분했던 것 같다. 그런 내가 지금은 눈을 싫어한다. 사람들이 눈을 밟고 지나갈 때마다 철퍽철퍽 지저분해지는 것도 싫었고, 그 눈이 꽝꽝 얼어 어쩌다 미끄러지는 것도 싫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나에게 눈이 '익숙'해졌기 때문이었다. 부산에서 올라와 이제는 매년 겨울마다 눈을 지겹도록 보니 그저 올해도 내린 눈, 작년에도 내린 눈, 내년에도 내릴 눈, 그냥 나에겐 매년 오는 눈이었다. 내가 처음 눈이란 걸 접했을 때의 마음은 너무 오래전의 마음이었다.
사물뿐만이 아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익숙함이란 있기에, 나는 익숙함에 흥미를 잃었다. 익숙함이 모두 식어버린 마음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익숙함은 식어버린 마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익숙함이 자리 잡은 내 마음 안에는 내가 그 사람을 알아온 시간만큼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있다는 오만이 자랐다. 그 안에서 나는 그 사람을 가두고 그 사람에게 다른 선택권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건, 익숙함에 대한 편견이었다. 나는 익숙함으로 잃어본 누군가를 잃어본 경험으로, 익숙함에 대한 감정을 더 깊게 생각해보고 싶었다. 내가 만들어낸 편견이 창을 부수고 나오기를 바랐다. 익숙함 속에 약간의 변화를 더해 익숙함이 새롭기를 바랐다. 익숙해서 어떤 변화조차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 것에도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자그마한 변화가 있고, 그게 곧 새로움으로 다가온다. 익숙함에서 조금만 관점을 다르게 해도 변화는 있다. 익숙한 상대에게도 식지 않을 수 있고, 이 익숙함을 지속할 수 있다.
다시, 올해 겨울에 내리는 눈이 기대가 된다.
'기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리는 꽤 친하다 (0) | 2021.06.17 |
|---|---|
| 이 글을 쓰는 동안 신분이 3번이나 바뀌었다_대학 5년의 복기 (2) | 2021.05.16 |
| 기억이 만들어내는 정체성_온전한 나에 대한 생각 (0) | 2021.01.08 |
| 벽이 다리가 될 때_어려움을 새로움으로 만드는 일 (0) | 2020.11.25 |
| 나는 침대를 뛰어 함께 우주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을 원했다 (0) | 2020.11.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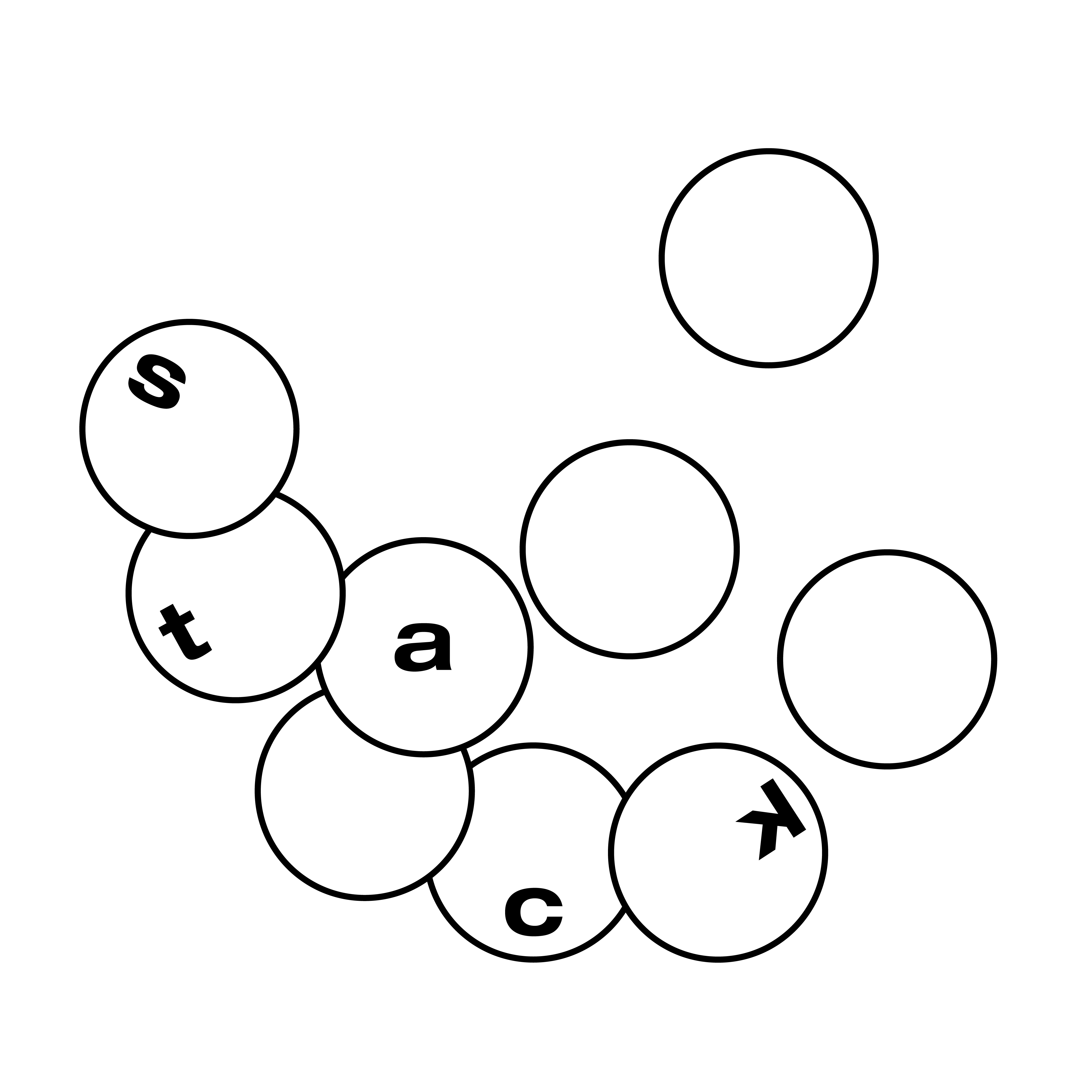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