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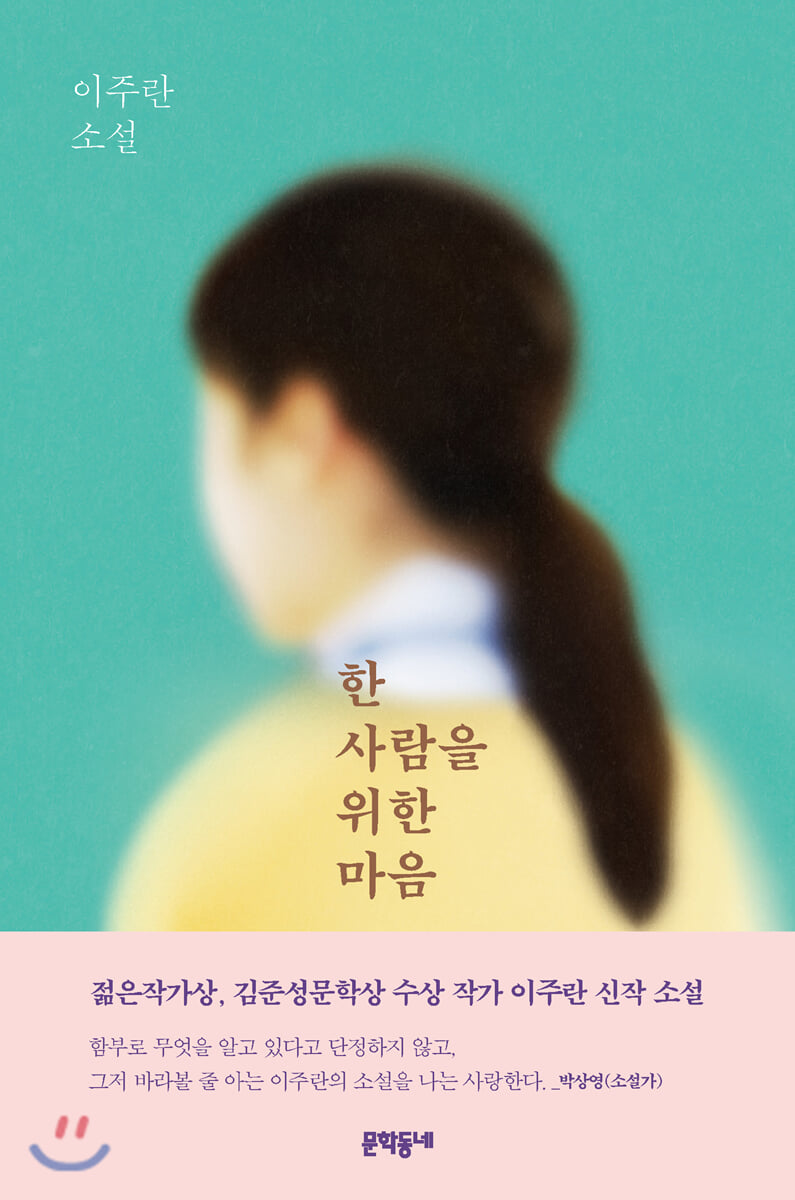
소설을 덮고 난 뒤, 쉽게 이해되지 않는 문장들이 몇 개 있었다. 자연스럽게 먼저 질문을 적어보게 되었고, 적어둔 질문을 의미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글을 적어보려고 한다. 소설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거리’가 아닐까 싶다. 소설에는 주인공과 대상 간의 물리적인 거리와 심리적인 거리를 수치적으로 또 행동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주인공은 ‘상상’으로 물리적 거리를 깨고 심리적인 가까움을 만들어 낸다.
소설의 첫 장면의 배경에는 여름 ‘비’가 내린다. 은이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일 년 내내 여름인 나라인 해변가에 와있는 듯한 착각을 한다. 빚을 갚느라 여행은커녕 여권도 없는 은이에게 어떻게 사계절 내내 더운 해변가를 떠올릴 수 있었을까? 또 벌초를 하러 갔다가 밤에 내리는 폭우를 보며 바닷가에 온 듯하다며 준과 함께 창밖을 오래 내다본다. 은이는 비를 통해서 현실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비일상적인 여행지의 모습을 떠올린다. 비는 일상과 비일상을 매개하는 매개체적인 역할을 한다. ‘상상’을 통해서 주인공은 물리적인 거리가 먼 여행지를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고 있다. 상상을 통한 심리적 거리의 단축은 다른 대상에서도 나타난다. 먼저, ‘여름’이는 지난 19년 동안 엄마랑 키우던 강아지로 지금은 현실에 없지만, 여름이를 생각하며 떠올리는 냄새와 뜨거운 체온만으로도 마치 여름이가 바로 옆에 있는 듯 느꼈다. ‘엄마’도 마찬가지이다. 취업 때문에 떨어져사는 엄마는 물리적으로 240km 떨어진 곳에 있지만, 전화기를 잡으며 목소리를 듣는 것, 엄마와의 추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은이에게 엄마는 심리적 거리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나 비는 일상을 대표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지하철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여자를 보며, 빚을 갚느라 지친 자신의 모습에 투영해보기도 한다. 비가 인간에게 있다면 눈물일 것이다. 그런 은이에게 준은 비를 잠시 피해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다. 준은 함께 발을 포개며 잠들 수 있는 사람이고 미용실 미용잡지를 보다가 영양크림을 사 오는 사람이니까. 그런 준과 은이는 꽤나 닮았다. 소설 속 준과 은이의 반대 인물인 외삼촌을 보여주며 둘의 공통점을 대조적으로 잘 보여준다. 외삼촌은 벌초하는 동안 행여나 햇빛에 탈까 선글라스와 모자를 챙겨온다. 은이도 벌초를 하러 가기 위해서 전날 밤 오래된 모자를 찾아둔다. 그러나 모자를 들고 가지 않는다. 선글라스와 모자는 자신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는 도구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가릴 수 있고, 치장할 수 있다. 은이가 모자를 챙겨가지 않은 것은 프로필 사진을 통해서 외삼촌을 먼저 보면서, 거리감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서였을 것이다. 준이가 시뻘겋게 익은 자신의 이마와 등을 은이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녀에게 숨길 것이 없는 사이이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그런 준이의 마음을 알았기에 은이는 눈물을 참았다. 반면 외삼촌은 관계를 돈으로 사는 사람이다. I가 학교를 가는 대신 홈스쿨링을 한다. 국, 영, 수, 바이올린, 요리 등 다양한 선생님들의 교육을 돈을 지불하면서 아이에게 학교를 다닌다면 자연스럽게 생길 관계를 돈을 통해서 만들어줬다. 외삼촌은 이번 벌초를 통해서 조카, 준을 처음 만날 때도, 보자마자 존댓말을 쓰며 회사 외부 사람을 만나듯이 명함을 줬고, 벌초가 끝난 뒤에는 일당 쳐주듯 돈을 건넸다.
그런 외삼촌이 건넨 매실차를 은이가 두 잔을 연달아 마실 때에도 준이는 반만 마시고 남겨둔다. 이런 모습은 은이가 친구 Y가 버리는 옷을 주울 때의 모습에 대입해 볼 수 있다. 은이는 Y가 버리는 브랜드 옷들을 마음 같아서는 다 챙겨오고 싶지만, 체면상 그중 한두 개만 집어온다. 내재된 욕망은 버리는 모든 옷을 다 가져오고 싶은 것이고, 표현된 행동은 그중 한두 개만 챙기는 것이다. 아마, 준도 내재된 욕망은 매실차를 다 마시고 싶지만, 표현된 행동은 그중 반만 마시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매실차를 반 남겨둔 준이의 모습에서 은이는 준에 대한 알 수 없는 믿음을 가진다. 자신과 비슷한 모습을 하는 준이를 보며 묘한 동질감과 애틋함을 느꼈을 것이다.
은이가 몸과 시간을 바꿔가며 빚을 갚을 때에도 그녀의 옆에는 준이와 엄마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힘든 것도 거기에 있었지만 행복도 거기에 있었다며, 오히려 부자가 된 것 같다고 말하는 은이다. 준이와 엄마는 은이에게 거센 비를 단단하게 막아줄 창문이었다.
은이에게 ‘비’는 특별한 소재이다. 자신의 현실을 투영하는 소재이기도 하지만, 비를 통해서 현실과는 다른 이상을 그려볼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다. 충분히 힘든 상황에서도 힘들어할 시간도 따로 내야 한다니 그런 그녀가 어딘지 모르게 안타깝고 쓸쓸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상황을 견디게 해주는 것은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택시 아저씨가 인생은 각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라 했지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듯하다.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과 닮은 준은 늘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배려 넘치게 그녀를 사랑한다. 준은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고 옆에서 더 힘이 되어야겠다며 나지막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준다. 그녀가 준을 사랑하는 마음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자꾸만 준의 표정을 살핀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준의 표정은 어떤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래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를 계속 예의주시한다. 그녀가 준을 더 많이 사랑해서 그런 것일 거라 생각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은 사랑하는 대상이 지금 어떤지를 계속 살핀다. 아마 그런 그녀에게 준은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였을 테니 말이다. 또, 어딘가 모르게 조금 부족해 보이는 엄마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거리가 멀지만, 늘 서로가 우선이기에 그녀는 이 사람들 곁에서 행복을 느꼈다. 진심으로 그녀가 엄마와 여권을 만들어서 비가와도 행복한 바닷가에 가기를 바랐다.
'독서 > 인문 | 소설, 에세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바깥은 여름, 김애란의 가리는 손_가려지는 이중성 (0) | 2020.11.15 |
|---|---|
| 한정희와 나 , 권여선의 손톱_돈이 휘두르는 삶의 범위 (0) | 2020.11.15 |
| 근처, 박민규(2009)_근처를 배회하는 삶 (0) | 2020.11.15 |
| 어느 밤, 윤성희(2019)_얼음을 녹이면 땡이 된다 (0) | 2020.11.15 |
| 당신의 노후, 박형서(2018)_이 꽃 같은 존재들 (0) | 2020.11.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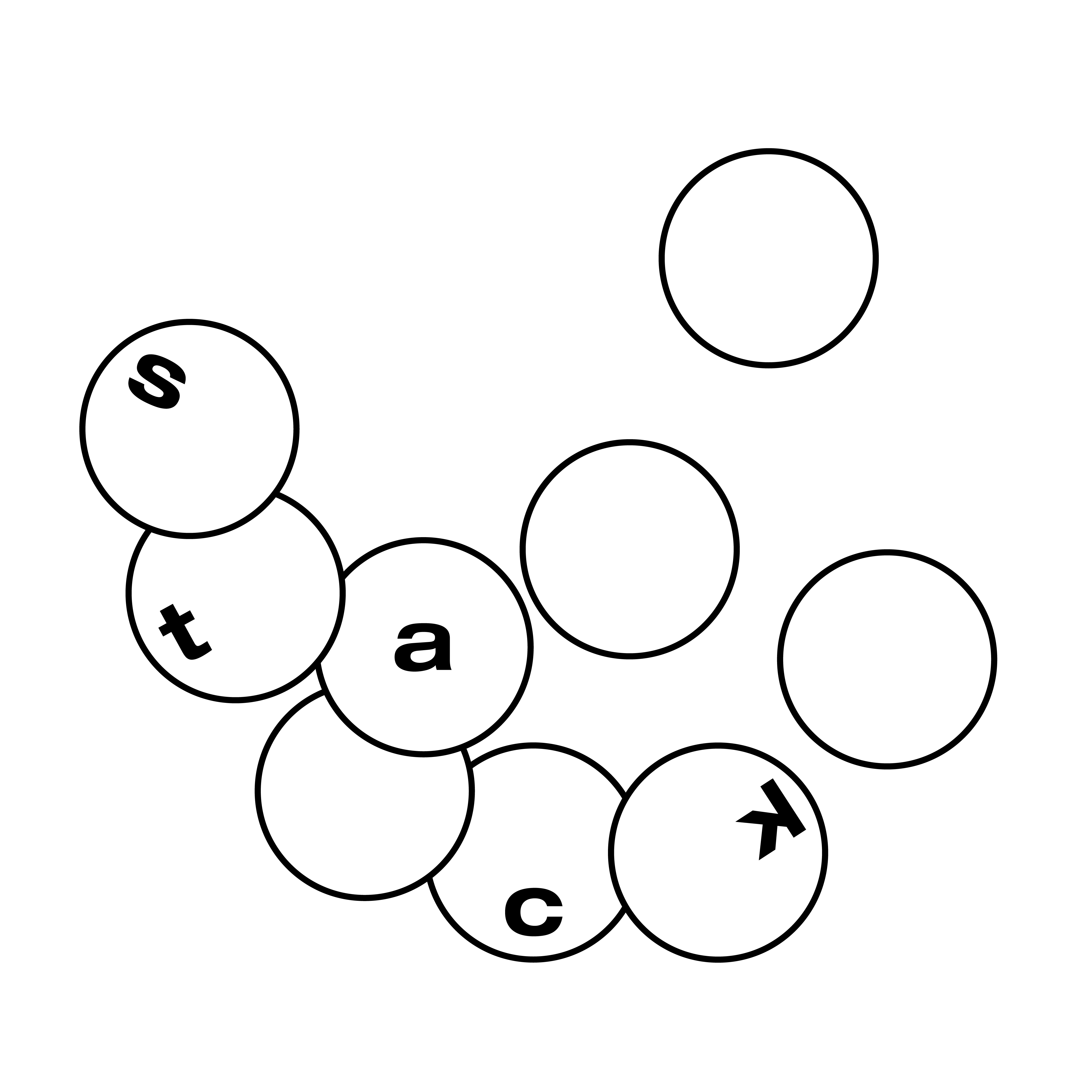





댓글 영역